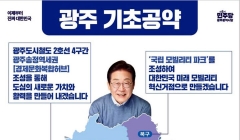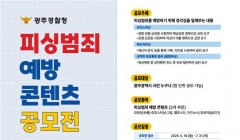베토벤 교향곡 9번의 자필악보 초고 부분. |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 |
 환희의 송가를 작사한 프리드리히 실러. |
 환희의 송가를 작사한 프리드리히 실러. |
 비엔나에 있는 베토벤 기념비. |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 9, d minor, op.125)은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독창자가 함께하는 매우 웅장한 작품이다. 화려한 작품은 연말의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관객들에게 강렬한 감동을 선사하기도 한다. 푸치니의 ‘라 보엠’과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이 크리스마스를 소재로 했거나 계절적인 특징을 소재로 한 특징이 있다면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 9번은 인류애와 자유, 평등, 박애의 이상을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특히 프리드리히 실러의 시 “환희의 송가(An die Freude)”에서 영감을 받아 이 시를 음악으로 구현하려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이 교향곡을 작곡했다.
●작곡 배경
1792년 베토벤은 실러(Johan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 1759~1805)의 시 “환희에 붙임”을 읽고 감동하여 추후 이 시를 활용한 작품을 만들고자 했다. 물론 당시는 베토벤이 22살이었고, 그가 아직 교향곡 1번을 만든 시기도 아니었다. 그저 그 시에 대한 동경과 시를 활용한 음악으로 완성했을 때 미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후에 음악의 소재로 만들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그는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도 인간 정신의 고귀함을 찬미하며, 음악을 통해 모든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 교향곡의 착수는 1815년 런덜 필하모닉 협회로부터 위촉을 받아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두 개의 교향곡을 병행하여 작곡하려고 했지만 포기하고, 하나의 교향곡으로 착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러의 시를 읽은 후로 30년이 지나 환희의 송가 선율이 만들어진 것은 1822년부터 시작되었다.
●초연 및 헌정
베토벤 교향곡 9번은 1824년 5월 7일, 미하엘 움라우프(Michael Umlauf, 1781 ~1842)의 지휘로 오스트리아 빈의 케른트너토르 극장(Theater am Karntnertor))에서 초연되었다. 베토벤은 청각 장애로 인해 직접 지휘하지 않았지만, 무대 위에서 공연의 진행을 도왔다. 합창 교향곡의 초연에 대한 많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그중에 두 번의 전체 리허설에 아직 젊다 못해 어린 여성 성악가 두 명이 함께한다. 소프라노 솔로는 18세의 헨리에테 손탁(Henriette Sontag)과 알토 솔로는 21세의 카롤리네 웅거(Caroline Unger)가 독창자로 참여했고, 테너는 안톤 하이징거(Anton Haizinger)가, 베이스 바리톤 파트는 요제프 자이펠트(Joseph Seipelt)가 초연 직전에 투입되어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초연이 이루어졌다. 또한 연주자는 아마추어가 많이 참여했고, 합창은 사고를 대비해 피아노가 참여해 합창을 유도했다고 전해진다. 이 정도의 초연이면 거의 무대 위에서 연주와 연습을 병행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워낙 대곡 편성에 연주기법 또한 복잡하여 당시 초연 무대가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는 대목이다.
이 교향곡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Friedrich Wilhelm III, 1770~1840)에게 헌정되었다. 이는 당시 음악 후원을 받기 위한 관례 중 하나였으며, 베토벤의 생계와 명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음악적 특징
베토벤 교향곡의 구성은 보통 4개 악장으로 소나타 형식의 1악장과 느린 3부 형식의 2악장, 3악장은 미뉴에트, 4악장은 소나타나 론도 형식을 취하고 있다. 물론 아홉 개 교향곡이 모두 다 같은 구성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그의 마지막 교향곡 9번은 앞서 작곡된 곡들과 다른 구조로 2악장은 스케르초 형식을, 3악장은 명상적이고 서정적인 느린 악장을 따르고 있다. 특별히 4악장은 네 성부의 독창자와 합창이 함께 하여 ‘합창’교향곡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유럽에서는 교향곡 9번으로 통용되고 있다.
전체 연주 시간은 한 시간이 넘을 정도로 대규모 구성에 팀파니 외에도 심벌즈와 트라이앵글이 사용되어 기존의 교향곡과는 형식과 규모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관점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환희의 송가
환희의 송가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상적인 세상을 노래한다. 기쁨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 가치로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된다, 네 부드러운 날개 아래서”를 표현하며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고 형제애를 실현하는 나아가 인류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하나로 연대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이상을 나타낸다. 즉 인류가 형제애와 평화를 통해 하나 될 때, 세상은 축복을 맞이하고 참된 조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실러는 “이 세상 위에 한마음이 있다면, 그는 우리의 친구가 되리라.”를 통해 하나의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고,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가사를 전달하고 있다.
●음악적 영향
사실상 교향곡에 합창이 포함된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베토벤 이전에 페터 폰 빈터(Peter von Winter, 1754~1825)가 ‘전쟁 교향곡’을 통해 완성됐다고 문헌을 통해 알려져 있지만 베토벤의 합창만큼 완성도가 높지 않아 오늘날 거의 연주되고 있지 않다. 합창이 가미된 교향곡은 이후 베를리오즈 극적 교향곡 ‘로미오와 줄리엣(Romeo et Juliette)’, 멘델스존 교향곡 2번 찬송 교향곡(Lobgesang, Hymn of Praise), 리스트의 파우스트 교향곡(Faust Symphony), 단테 교향곡(Dante Symphony) 등에 의해 완성되었고, 낭만주의 이후 말러의 교향곡 2번 ‘부활’과 교향곡 3번, 또 천인교향곡으로 잘 알려진 교향곡 8번을 비롯해 근데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3번 ‘바비 야르(Babyn Yar)’와 히나스테라의 교향곡 3번 찬가교향곡(Cantata Symphony), 번스타인의 교향곡 3번 카디시(Kaddish)까지 대규모 교향곡의 웅장함을 독창자와 합창단에 의해 들여주고 있다.
베토벤 교향곡 9번의 메아리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음악적 메시지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이 곡이 초연된 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오케스트라와 공연장에서 울려 퍼지는 이유일 것이다. 평화, 인류, 존중, 배려, 화합, 형제애 등 실러가 담고자 한 음악적 메시지는 너무 분명하고, 이상적이다. 지금도 전쟁과 갈등 속에서 살고 우리에게 성찰하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이 작품이야말로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음악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