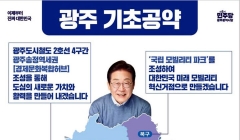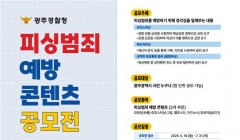|
세계적인 법철학자 한스 페터 그라베르 노르웨이 오슬로대 법학과 교수는 신간 ‘정의를 배반한 판사들’(진실의힘)에서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들며 사법부의 참담한 현실을 신랄하게 고발한다.
저자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이자 인권의 수호자여야 함에도 현실의 판사들은 자주 그 기대를 배신해왔다고 지적한다. 나치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라틴아메리카 군사독재 정권은 물론 자유주의 체제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과 영국의 실제 사례를 들어 국민을 억압하는 정권에 협력하는 판사들의 행태를 비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 정부의 구금 명령을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영국 상원의 결정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미국 대법원의 강제 불임수술 정당화 판결 등을 거론한다. 저자는 이 판결들은 모두 형식상 합법의 겉모습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권을 유린하고 억압에 가담한 판결이었다고 꼬집는다.
저자는 판사들이 때로는 독재 정권이 만든 법을 단순히 시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적 창의성’을 발휘해 억압에 앞장서기도 했다고 비판한다. 유대인과 독일인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나치의 ‘뉘른베르크혈통보호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독일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유대인과 독일인의 혼인을 금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저자는 판사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정부에 동조하는 이유 중 하나로 ‘계급적 이해관계’를 든다. 엘리트 계층인 판사들은 경력과 승진을 위해 자연스럽게 권위주의 정부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판사라는 직업 그 자체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판사는 본질적으로 법의 권위에 복종하는 존재이기에 권위주의 정권이 만든 실정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억압에 동조한 판사들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이 판사들의 이 같은 행태를 더욱 조장한다. 저자는 판사들은 거의 예외 없이 지난 정권의 악행과 억압에 가담한 책임을 묻는 법정에 서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특히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조차 나치 독일에 동조한 책임을 물어 처벌된 판사는 단 한 명에 불과했다고 짚는다. 유죄판결을 받은 대부분은 법무부에서 정책 수립과 법 집행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들이었고, 법정에서 가장 강력하게 히틀러를 지원했던 판사들은 대부분 법적 책임을 모면했다.
다행히 억압에 저항한 판사들도 있었다. 나치 독일에서 정신질환자 안락사 프로그램에 항의한 로타 크라이지히 판사, 나치 점령군에게 반대하며 집단 사임한 노르웨이 대법관들, 인종차별 법 적용을 거부한 벨기에 법원 등이다. 저자는 이런 사례들이 사법부가 극한의 상황에서도 정의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고 위안 삼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