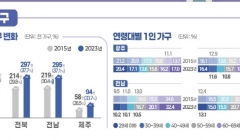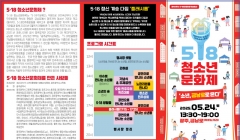맑게 개인 ?두산 천지. 2024년8월15일 광복절날 백두산 천지를 영접한 순간은 아직도 짜릿하다 |
 2024년 광복절 날 천지에 오른 범도루트 대원들. |
 거대한 물줄기를 ?아내는 장백폭포 |
 거대한 물줄기를 ?아내는 장백폭포 |
●천지 등정 4개코스…북파코스로 출발
호텔 옥상에 갔다. 넓은 공간에 다양한 시설이 있다. 결혼식장, 육상트랙, 낭만포차도 있다. 사방팔방을 볼 수 있으나 백두산 쪽은 안개 속이다. 백두산 천지를 영접할 수 있을까. 호텔 입구로 내려왔다. 인삼과 더덕, 과일을 파는 동포들이 있다. 그 틈바구니로 갑자기 비옷 장수가 나타났다. 그는 ‘비옷 천원’을 외친다. ‘아, 천지 쪽에 비가 내리고 있나?’ 걱정이다. 버스는 백두산 밀림을 통과하고 있었다.
백두산 북파는 하루 4만명으로 입장을 제한하고 있다. 요즈음 한국인보다 중국인 방문이 더 많다고 한다. 백두산은 ‘중화 10대 명산’이며 ‘중국 국가급 5A 여행 구역’으로 지정돼 중국인들에게도 사랑받는 산이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과 백두산, 연변지역을 연결하는 관광정책과 한류 영향도 크다.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는 코스는 4개다. 북파, 서파, 남파는 중국에 있고 동파는 북한에 있다. ‘파’는 고개(坡)를 의미한다. 북파는 자동차를 타고 천지에 가장 가까이 오를 수 있다. 하산길에 장백폭포가 있어 가장 인기있는 코스다. 서파코스는 1442계단을 걸어야 한다. ‘삼보승차(三步乘車)’가 생활화된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루트다. 중국 국경표지석 37번이 사진 핫스팟이다. 남파코스는 북한과 국경이 인접한 관계로 검문검색이 많고 하루 1500명으로 제한한다. 동파코스는 북한에서 오르는 코스다. 관광용 지상 궤도 열차와 케이블카가 설치됐다고 한다. 2018년 남북 정상이 올랐던 길이다.
 레이펑 청년 병사의 흉상 사회주의 프로파간다의 한 장면 |
 백두산 북파코스 주차장과 천지로 오르는 인파 |
 백두산 천지에 오르는 범도루트 대원들 |
천지로 가는 길. 가이드 선생은 “우리는 VIP코스라서 가장 빠른 시간에 오를 수 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줄 서는 시간은 적었다. 중간에 셔틀버스로 갈아탔다. ‘장백산 북파 환승센터’에서 10명씩 승합차에 오른다. 꼬불꼬불 시멘트 도로를 거침없이 달린다. 위험천만이다. 해발 2000m 지점을 지나자 맑은 하늘이 나타났다. 승합차 안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어느덧 천지 바로 밑 거대한 주차장에 도착했다.
천지를 오르는 코스는 A·B코스 두 군데다. 천문봉에 가려면 A코스로 가면 된다. 벌써부터 만원이다. 사람들을 따라 올라갔다. 천문봉의 인파를 조절하는 듯 위쪽에서는 막고 있는데 아래쪽에선 인파가 밀려온다. 그 와중이 인파에 끼어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 그저 기다릴 뿐 어쩔 도리가 없다. 조금 더 오르자 중국인 안내원들이 핸드마이크를 들고 빨리 이동하라고 난리다. 중국말과 한국말을 섞어 “빨리 빨리”를 외친다. 이렇게 천지에 도착했다.
천지를 영접한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짜릿하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 첫 소절에 나오는 그 곳이다. 그 천지가 바로 내 눈앞에 펼쳐졌다. 3대가 덕을 쌓아야 본다는 그곳! 하늘이 허락한 순간이었다. 설명으로 하기 어려운 감정이다. 그것도 ‘광복절에 천지라니’. 연길파옥투쟁과15만원 쟁취, 창동학교 등 한인 민족학교, 봉오동·청산리 대첩의 수많은 영웅들이 떠올랐다. 그들이 꿈꾸었던 해방된 조국, 통일된 조국을 기원하며 백두산 천지와 북녘 하늘을 가슴에 담았다. 한반도의 백두대간을 그려온 영암 출신 김준권 화백은 천지를 그림으로 옮기고 있었다. 경치가 가장 좋은 장소에 커다란 데크가 설치됐다. 출입을 통제한다. 일 인당 30위안을 내야 한다. 역시 상술은 중국인이다.
백두산 천문봉 표지판이다. 해발 2660m, 북위 42°1′33″, 경도 128°3′59″. ‘천문봉에 올랐으니 모두 사업 성공하세요(登上天文峰 事業皆成功)’라는 문구가 우리를 반긴다. ‘백두산 2744m’라는 표지판을 보고 싶다. 다음번엔 동파코스로 천지에 오르겠다고 소망했다. 쉼없이 오르내리는 승합차와 위험천만한 도로, 부지런한 인간들의 노력이 가상했다. 기념품으로 ‘장백산천지(長白山 天池)’라고 쓰인 마그네틱도 구입했다.
다시 승합차를 타고 내려간다. 오를 때와는 또 다른 풍경이다. 백두산의 장엄함,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장백폭포로 가는 길, 데크길은 잘 조성됐다. 수많은 인파 속에 거대한 폭포가 나타났다. 이제껏 봐온 폭포 중 제일 크다. 천지의 물이 천문봉과 용문봉 사이로 흘러 내리다 승사하로 합쳐져 장백폭포에 도착한다. 장백폭포는 68m 수직 절벽이다. 폭포는 크게 두 갈래 물줄기로 나뉘어졌다. 동쪽 폭포 수량이 전체 수량 3분의 2를 차지하며 송화강으로 유입된다. 내려오는 길엔 유황온천 달걀 한입, 시원한 음료는 필수다. 백두산엔 천지가 있고 장백폭포엔 사람 천지다.
●동아일보 ‘백두산=영산’ 표현 최초 게재
궁금증이 생겼다. 언제부터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영산(靈山)이 됐을까.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봤다. 고려·조선시대, 백두산은 조종산(祖宗山)으로 ‘지리적인 표상’이었다. 조선 후기 일본 통신사 일행 중 백두산과 후지산을 비교하기도 했다. 영조 때 백두산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백두산이 한반도 모든 산맥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이후 백두산을 직접 답사하고 기행문을 남기는 경우도 있었다.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지면서 백두산과 북방 영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반면 ‘조선은 소중화(小中華)’라며 ‘백두산도 중국 곤륜사(崑崙山)의 한 지맥’이라는 사대주의적 인식도 존재했다.
백두산에 관해서는 신채호(申采浩·1880~1936)를 주목해야 한다. ‘민족의 영산’이라는 직접적 표현은 없었으나 그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인물이다. 그는 백두산에 올랐으며 고구려와 발해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조선상고사를 체계화 했다. 그는 “삼국사기를 백번 읽는 것보다 만주 지역 고구려 유적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만주 고토를 찾아다녔다.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한 독사신론(讀史新論)에서 “삼국유사의 태백산은 묘향산이 아니라 백두산이며 백두산에서 단군이 탄생했다”는 ‘단군 탄강지론’을 주창했다. 1909년 나철(羅喆·1863~1916)은 단군교를 세우고 신채호의 설을 이어받았다. ‘탄강지론’은 1910년대엔 대종교에서, 1920~30년대엔 동아·조선일보에서 확대 재생산했다. 두 신문사는 경쟁적으로 백두산 탐험대를 조직했다. 강연회, 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했다. ‘탄강지론’은 대중들 사이에 크게 확산됐다. 최남선(崔南善·1890~1957)은 ‘백두산 근참기’라는 기행문으로, 권덕규(權悳奎·1891~1950)는 ‘조선 역사와 백두산’이라는 강연으로 ‘탄강지론’을 설파했다. 동아일보 기자로 백두산을 등정했던 민태원(閔泰瑗·1894~1934)은 백두산 사진을 환등기로 상영하며 백두산 모험담을 전파했다. 동아일보가 민태원의 강연회를 홍보할 때 ‘최초로 전개되는 영산의 대신비’라는 제목를 달았다. 이때 ‘영산’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산이란 표현은 조선시대, 대한제국 시기에 쓰인 사례가 없다. 아마도 일본에서 들어온 것 같다. 일본에서는 예부터 3대 영산으로 후지산(富士山), 하쿠산(白山), 다테야마(立山)를 꼽아왔다. 후지산은 일본 대표 영산으로 일컬어졌다. 백두산을 영산으로 칭한 것은 ‘일본엔 후지산, 우리는 백두산’이라는 대응 논리로 이해된다.
●여권없이 백두산 동파코스 올랐으면…
일제강점기, 백두산 주변 봉오동·청산리로부터 들려오는 다양한 승전보는 한인들의 기억에 남았을 것이다. 해방 이후 북한에서는 백두산을 혁명의 고향, 김일성 일가의 항일 성지로 우상화했다. 소위 백두혈통이란 말이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남한 사람들은 백두산에 갈 수 없게 됐다. 애국가의 백두산은 상상 속의 산, 관념 속의 산이 됐다. 1994년 연길공항에 열리면서 백두산 관광이 시작됐다. 자연스럽게 백두산은 민족의 영산으로 재부상 했다. 백두산은 단순한 지리적 표상보다 역사적 표상으로 의미를 더 하게 됐다. 백두산 방문은 통일에 대한 강렬한 염원의 표출로 해석 될수 있다. 백두산은 일제강점기와 민족 분단의 상황을 거치면서 ‘민족의 영산으로’ 자리매김 됐다. 그러나 민족의 영산은 아직 미완성이다. 분단 조국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여권없이 동파코스로 백두산에 가면 좋겠다. 북한 량강도 삼지연시에서 장군봉을 거쳐 백두산 천지에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날이 오길 간절히 바란다. 이진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수석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