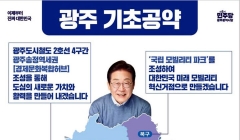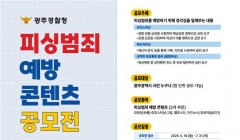|
산불확산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도 앞다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산불재난 대응에 나섰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달 31일 동부청사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에서 청명·한식 대비 특별대책을 살피고 대규모 산불 양상에 맞춰 드론 등 장비 고도화를 통한 신개념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경남·경북지역 대형산불은 피해 규모·범위, 확산 속도 등 현재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피해 양상을 보였다"며 "이제 산불대책도 새로운 양상에 맞게 예방·대비·대응에 있어 새로운 산불방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시했다.
이날 점검은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계속된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하지만 봄철은 언제나 산불에 노출되는 계절이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청명과 한식 등 입산객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언론 등 매스컴에서도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크고 작은 산불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산불피해 최소화는 발생 후 최단시간 초동진화가 핵심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산불조기경보시스템'이 눈길을 끈다. 이 시스템은 AI 관제를 통해 포착한 뒤 산불발생 전 연기를 초기에 탐지하고 빠르게 작동한다. 주민들이 인근에서 산불을 확인하고 119에 전화를 걸기 전 최소 7~10분 먼저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산불은 초기 대응이 피해 규모를 결정 짓는다. 7~10분 전 조기경보는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피해를 막느냐 못 막느냐 판가름 하는 시간이다. 인명과 재산피해 등을 막는 분수령인 셈이다. 초기 탐지를 통해 대형 피해를 차단한 사례는 많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번 경북 의성 산불의 경우 CCTV 카메라 화각(火角)에서 벗어난 곳에서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조기탐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례는 AI 기술이 화재를 감지할 수는 있으나 인프라 미비로 초기 진화 시기를 놓쳤음을 의미한다. 조기 탐지와 신속 대응을 실현하려면 더 많은 산불감시 CCTV 설치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취약 지점과 사각지대를 보완해 더 완벽한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AI기술이 아직 초보단계다. AI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법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산불감시를 위한 CCTV 설치 등 인프라가 확대돼야 함은 물론이다. AI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고 더넓은 범위를 관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불예방 정책에 투자를 소홀히 했다가는 더 큰 손해를 입게 됨은 불문가지.
이번 울산과 경남·북 산불피해를 교훈 삼아 광주와 전남·북 지역도 산불감시 체계를 전면 재점검·보완해야 한다. 생명과 재산,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막대한 복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예방과 대응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 'AI산불조기경보시스템' 도입으로 산불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