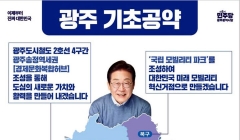|
지금도 기성세대들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벌어진 결과를 받아들이고, “팔자려니”하며 서로 위로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선조들은 팔자로 여겨지는 인간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피해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개인의 태어난 날의 천체의 위치를 기록해서 길흉의 기운이 오는 때와 장소 등을 알아보려고 했고 그 흉한 기운을 피해가려 했다.
즉, 팔자라는 개념은 운명에 대한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한 미래에 맞서 평온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에서 비롯된 개념인 것이다.
인간의 심리는 서양 학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본주의 심리학자 매슬로우(A. Maslow)는 1943년 ‘인간 동기의 이론’ 논문에서 욕구 5단계설을 주장하며, 인간이 생리적 욕구 다음으로 안전의 욕구를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위치시키는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동·서양의 학문적 고민은 모두 안전을 개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시각으로 연구된 것이다. 과거에는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안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상황이 다르다. 위험은 더욱 복잡해지고 예측이 어려워졌으며, 결과도 끔찍한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제는 잘 짜여진 사회 시스템만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대로 변했다.
촘촘한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우리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문화적 울타리를 튼튼히 다져가고 있다. 안전정책을 총괄해 75개 재난유형별 168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세부대책을 수립하고, 생활 속에서 안전 문화 실천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나가고 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로는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이 있다. 이 보험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를 포함해 총 13개 항목을 보장한다.
전 연령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시민 참여형 시스템으로는 학교 주변의 위험 요소를 찾아 안전신고 활동을 펼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와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보안관’ 등이 있다.
우리시는 생활 속 안전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누군가의 가족인 근로자와 시민이 일선 산업현장과 공공의 영역에서 안전사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안전교육과 점검 등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재난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통해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보완해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지역 맞춤형 안전 사업 발굴
새로운 기술 개발로 재난을 스마트하게 대비하고, 영리하게 풀어나가는 기술을 개발하는 개인과 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재난안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수많은 법, 시스템과 조직이 정비되어도 제도의 성공은 결국은 그 제도를 운영하는 개인의 열정과 참여에 달렸다. 시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안전한 사회로 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없다. 다행히 우리시는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 3만6,688건으로 전국 17개 시·도가운데 2위를 차지해 안전한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긍정적인 시민의 안전에 대한 참여의식이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 안전사고는 더 이상 정해진 운명이 아니다. 과거처럼 하늘의 탓으로 돌리는 이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만든 사회 안전망과 우리의 참여로 막을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