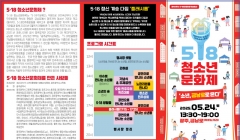혹자는 증여가 개인간에 그것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국세청에서 어떻게 증여사실을 알까 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거의 모든 과세자료를 수집·전산입력해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등록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변동사항은 물론이고 각종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거래된 자료도 대부분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증여를 받았으면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3%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다.
또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1일 0.022%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1,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하는 수증인이 신고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증여등기일의 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나서 증여세가 고지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0만원과 납부지연 가산세 80만3,000원을 더해 1,291만2,5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정상신고시에는 신고세액공제 3%에 해당하는 30만원을 감면받아 97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므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자가 신고 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신고한 사람에 비해 20% 이상을 더 내야 한다.
물론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를 해도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즉 신고를 하나 하지 않으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해 놓으면 나중에 증여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해 놓는 것이 좋다.
한편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는 그 공제 한도가 2,000만원이 적용된다.
다만,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부친이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이때 계모는 4촌 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에 해당돼 5,0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이 공제된다. 광주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