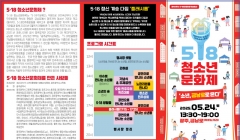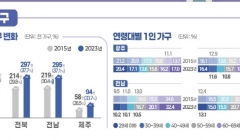앤소니 맥콜 _Light describing a cone(1973) |
작년과 올해 만들어진 국내외 실험영화들 안에서 영화제에 상영할 작품들을 선정하는 심사로, 매년 1,000편 이상 접수된 작품들 안에서 30편 내외를 선정하기 위해 필자를 비롯한 네 명의 심사위원들이 각자 선정한 작품들을 가지고 자정이 넘도록 의견들을 주고받았다.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처럼 특정 장르가 집결된 영화들을 심사하다 보면 현재 그 장르가 주목하는 동시대적 흐름과 형식들을 발견할 수 있다. 작년과 올해는 유독 에세이 형식의 영화들이 많았는데 이전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이라면, 개인적 이야기 혹은 심상을 다뤄왔던 주관적 형식에서 보다 자연, 환경, 지역의 정세 등 거시적인 주제들을 개인의 철학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작품들이 국가 불문하고 많아진 점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디지털 효과들을 활용한 유미주의적 실험보다는 필름 자체가 지니는 질료로서의 특성, 프레임 안에 담긴 풍경의 의미, 프레임 사이사이의 호흡과 색감 등에 집중하며 실험영화 본연의 미학적 탐구에 집중하고자 하는 작가들이 유독 많아졌다.
한때 상업영화들 사이에서 예술적 지위를 고수해온 실험영화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과도기를 겪으면서 테크노크라트적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일 때도 있었다. 실험영화는 태생적으로 기술장치에 친숙한 장르이기에 디지털을 활용한 이미지의 변용은 훨씬 쉽고 유리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기계가 더욱 똑똑해졌다고는 하나 이미 70년대에 VR이나 멀티 프로젝션, 이미지와 사운드 간의 운동성과 같은 실험을 수공업처럼 만들어냈던 역사를 돌이켜볼 때, 결국 예술과 기술을 구분하는 미학적 성취는 작가의 주제의식과 매체 본연의 탐구에 있음을 말해준다. 현재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융복합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때 어떠한 작품을 놓고 융복합 ‘예술’인지, 융복합 ‘기술’인지 구분하는 잣대에 있어서도 고민해봐야 하는 지점이다.
 스탠 브래키지_Mothlight(1963) |
제2차세계대전 이후 아방가르드 운동은 북미로 옮겨가며 더욱 구체성을 띠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실험영화와 예술의 본질을 재료가 지닌 물질성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대문자 모더니즘과 현재 백남준, 존 케이지 등으로 대표되고 융복합의 시초라 할 수 있는 플럭서스 운동의 흐름과 공생하며 발전해나갔다는 부분이다. 어찌 보면 실험영화의 역사는 영화보다는 미술사 안에서 보다 풍부하게 미학적, 비평적 담론들을 만들어냈고, 이러한 과정들이 현재 영화관보다 미술관에서 실험영화들을 만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실험영화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극영화, 즉 ‘이야기(내러티브)’ 중심의 영화라기보다는 ‘그림(이미지)’로서의 영화로 설명할 수 있으며, 타 장르와는 달리 시공간의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을 더욱 강조하면서도 고전주의가 지니는 사실성, 곧 극영화가 가지는 이야기의 몰입과 전개방식을 경계한다.
실험영화가 고전적 형식의 극영화와 차이를 두고자 하는 전략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영화장치의 물질성 탐구로, 셀룰로이드 필름 한 장 한 장을 캔버스로 생각하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붙이기도 하며, 태우거나 긁어내고 영사하는 방식, 여러 대의 스크린 사이에 빛을 투과하여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방식, 컴퓨터와 오디오를 활용하여 이미지와 소리 간의 관계성을 퍼포먼스 형식으로 보여주는 방식 등 영화라는 광학장치가 지닌 특성들을 조작하고, 타 장르와의 결합을 통해 시공간성을 확장시키는 방향이다.
 스탠 밴더빅 _ Movie Mural(1965-1968) |
어트랙션과 같은 영화들이 영화관들을 점유하고, 그 밖의 영화들이 OTT 플랫폼 안에서 생존하는 가운데 실험영화들은 미술관 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영화관처럼 스크린과 영사기의 일대일 방식, 때로는 멀티 프로젝션이나 모니터로, 혹은 퍼포먼스로 다양하게 변용가능한 장르적 특성이 미술관이라는 유연한 공간에서 공생하며 대표적인 무빙이미지 작품이 되었다. 프랑스의 퐁피두센터와 미국의 모마에서는 오래전부터 실험영화들을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연구하고 있으며, 모마는 실험다큐멘터리 영화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아방가르드의 종언을 말하면서도, 새로운 매체와 장르, 공간들을 횡단하며 과거의 유산들을 이어가고 있는 실험영화의 가치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도 올해 20회를 맞이했다. 타 국가와 달리 유독 국내 교육제도와 예술정책에서 등한시했던 실험영화의 저변을 확대해가며, 영화 안에서의 이단아, 미술 안에서의 이방인 치부를 받아야 했던 국내의 영화와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활동영역을 교차시키고 확장시킨 플랫폼으로서의 성과는 매우 크다. 힘든 투쟁처럼 지속해왔던 업적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7월에 개최되기 전에 실험영화를 보고 싶은 관객들은 광주비엔날레에서도 많은 실험영화 감독들의 작품들을 발견할 수 있으니 OTT 플랫폼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영화의 스타일들을 경험해보기를 바란다.
/김지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학예연구관
 스탠 밴더빅 _ Movie Mural(1965-19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