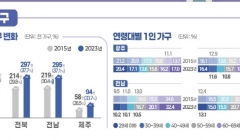2만5,000개의 비디오테이프를 장르별, 연령별, 감독별로 구분해 선보이는 복고풍 전시 ‘원초적 비디오 본색’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전시 5관에서 열리고 있다. 전시는 내년 2월19일까지 계속된다. |
 ‘원초적 비디오 본색’ 전시 전경 |
문화예술은 나날이 디지털 기술로 인해 풍요롭고 화려해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제공해주는 편의성과 풍족함은 OTT플랫폼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선택’과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시간의 절약과 함께 언제든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안도감을 준다. 돌아가는 찰나에 나의 취향까지 정해주기도 한다. 알고리즘은 편리함을 제공해주지만, 스스로 결정하고 찾아내려는 간절함과 거기서 얻게 되는 쾌감을 단절시킨다. 필자는 줄곧 디지털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지만 최근에서야 그 이유가 디지털의 피상성 때문이 아니라, 디지털에서 느끼지 못하는 간절함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1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영화와 음악을 간절히 찾아다녔던 기억들은, 비디오테이프 4~5편 대여 비용이면 OTT에서 수백편의 영화를 맘껏 볼 수 있고, 연체료까지 낼 수 있는 비용이면 또 다른 OTT 플랫폼에서 수십편을 골라볼 수 있는 현재와 대체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비디오 창고에 있는 조대영/최성욱 촬영 |
이후 잔상이 떠나지 않아 비디오가게에서 조심스럽게 비디오케이스를 찾아봤다. 케이스에는 “예술이냐, 외설이냐”와 함께 ‘귀재(鬼才)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라고 써 있었다. 이후로 예술과 외설의 논란에 서있는 영화들을 찾아 맘씨 좋은 여자 사장님이 계시는 날 몇 개의 비디오 중에 하나씩 넣어서 혼자 있던 낮에 학원가기 전 빨리감기로 제일 먼저 보고 바로 반납하곤 했다.
그러다 하루는 빨리감기를 멈추고 영화란 게 무엇인지 자못 진지하게 생각했다. 영화의 미장센부터 음악, 촬영, 편집 등이 아우러진 연출기법과 기능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영화를 만든 감독에게 경외감이 들었다. 나의 불순(?)했던 의도를 반성하면서 영화를 예술로 맞이한 순간이었다. 그 작품은 바로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정부’였다. ‘피터 그리너웨이’감독을 처음 알게 됐고, 이후 이 감독의 ‘동물원’, ‘영국식 정원 살인사건’ 등의 영화들이 미치도록 보고싶었지만, 내가 살던 동네 주변의 비디오가게를 모두 뒤져도 찾을 수가 없었다. 나는 ‘키노’에 가끔 등장하는 감독의 근황과 정보들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고, ‘키노’에서 꼭 봐야 한다는 대부분의 영화들은 우리 동네에서는 볼 수 없다는 데 매번 실망했다. 과연 ‘키노’의 필진들은 이런 영화들을 다 보기는 한 건지, 어디서 테이프를 구하는 건지 의심 반 부러움 반으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그때 그 기억을 간직하면서 나중에 커서 비디오 사장이 되거나 이 비디오를 죄다 볼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필자는 결국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때 보고 싶었던 비디오를 보거나 복사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쏟았다. 그 시절에 본 영화가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본 영화보다 훨씬 많을 정도도 10대와 20대를 비디오와 함께 살았다.
 ‘원초적 비디오 본색’ 전시 전경 |
사용가치가 사라진 것을 되살리는 방법은 그것을 제도적 틀 안에서 전시화하는 방법이다. 이미 복제품들이 유령처럼 떠도는 예술 공간에 물성 그대로의 것은 더 강한 고유성을 발휘한다. 여기에 공동의 삶과 기억이 담보된다면 순간적인 체험 이상의 여운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조대영 선생님께 이 비디오테이프를 모두 바깥으로 꺼내 전시하자는 제안을 드렸고, 선생님은 “함 해보시죠!”라는 말씀으로 수락해주셨다. 만약 선생님께서 흔쾌히 동의해주시지 않았다면 이처럼 무모한 시도를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다.
나와 비슷한 세대, 그리고 나의 선배, 부모님 세대들은 모두 비디오에 대한 강렬한 추억을 가지고 있다. 비디오는 OTT에서 경험하는 병렬적 시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생하거나 잠시 멈추거나 아니면 되돌리는 단순한 작동논리 안에서 많은 사건들과 추억을 만들어낸다. 필자는 몇차례에 걸쳐 비디오 시대의 개인적 단상들을 꺼내보고자 한다. 지금은 희귀한 유물이 되어버렸지만, 다른 어떤 장치보다 간절함을 주었던 비디오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레트로가 아닐까.
 ‘원초적 비디오 본색’ 전시 전경 |
‘원초적 비디오 본색’ 아날로그 미학·영화광 탄생
K-컬처가 국제문화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지금의 한국영화에서 ‘비디오테이프’의 유산은 무시할 수가 없다.
비디오 산업의 호황기는 영화전문잡지와 영화애호가(씨네필)의 등장, 대기업 자본에 의한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 영화의 학문제도 편입 등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산업의 생산자 혹은 수용자들은 ‘비디오 키즈’로서 VHS를 통해 영화를 향유하고 이해하며, 또 수집하기도 했다. 비디오는 1976년 일본의 전기회사 ‘빅터(JVC)’가 가정용 비디오테이프 모델(VHS)을 생산하면서 대중적으로 보급됐다. VHS의 실용성은 영상 시장의 활성을 가속화시켰고, 영상제작사와 유통사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까지 진입하며 문화 활동의 큰 축을 차지하게 되었다. 예술 안에서는 VHS의 생산 이전인 1950년대부터 ‘소니(SONY)’에서 생산한 포터백 카메라를 통해 비디오 매체에 대한 실험들이 이루어졌다.
‘▶재생 II일시정지 ■정지 그리고 ◀◀ 되돌리기’라는 비디오의 재귀적, 촉각적 특성은 매체를 형식적 도구가 아닌 심리적인 장치로 활용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비디오아트에서 ‘나르시시즘의 미학’이라고 일컬어지던 ‘자기반영성’은 오늘날 이른바 ‘셀프카메라’와 자신이 직접 등장하는 ‘유튜버’들을 연상케 한다. 이처럼 참여적이고 소통적인 비디오는 한 세기의 문화예술 전반에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으며, 개인과 공공의 역사에 자리 잡고 있다.
‘원초적 비디오 본색’은 비디오의 역사 안에서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VHS’, 그 안에서도 대중적으로 소구되어 왔던 ‘영화’에 집중하고자 한다. 영화 비디오 문화는 생산자와 수용자, 제도권과 비제도권 모두 실천적이고도 매우 능동적이었다. 전시된 VHS 대부분은 광주영화인 조대영씨의 소장품들로, VHS를 날 것 그대로 전시 소재에 사용함으로써 현대에서 느끼기 어려운 ‘물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전시 ‘기획의 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