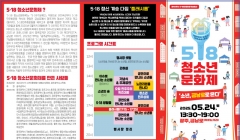|
모든 연령층에 인기…출연했다 하면 매진
배우·교수·예술감독 등 활약 팔색조 매력
[ 전남매일=광주 ] 민슬기 기자 = 고희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배우는 흔치 않다. 특히 젊은층에서 노년까지 다양한 관객층을 아우르며 전 회차 전 좌석 매진인 ‘티켓파워’를 가진 이는 더욱 드물다. 월간 전남매일은 11월호 ‘주목! 이사람’에서 배우·교수·예술감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팔색조 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성녀 (69)씨를 만났다.
다섯 살때 여성 국극배우였던 어머니 고 박옥진 여사의 아역으로 무대에 섰다. 이후 65년간의 긴 세월 동안 장르를 넘나드는 연기력으로 지금껏 무대에 서며 이름 그대로 ‘스타(star)’의 삶을 살았다.
배우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면서도 중앙대 음악극과 교수,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등 예술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녀는 언제나 ‘지금’이 전성기다.
배우 김성녀의 무대 인생을 논하려면 어머니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김성녀의 어머니인 고 박옥진 여사는 열두살 무렵부터 창극단에서 활동했는데, 인간문화재 김연수에게 판소리를, 이매방에게 춤을 배운 예인이었다. 1950년대 유행하던 공연인 여성국극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던 박옥진 여사는 고 김향 선생을 만나 가정을 이룬 뒤 ‘삼성(三星) 여성국극단’으로 활동했다.
김향 선생의 극본과 연출, 모친과 이모(박보아), 외숙모(조양금)등 세 명의 주축 배우로 이뤄진 국극단은 전국 유랑을 다니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들은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햇님 달님’ 등 야사와 설화 위주를 다뤘다. 여성들이 남자 역할까지 자연스럽게 소화해내고 창과 무용, 연극을 넘나드는 유연한 종합 예술이라 현재 아이돌 못지 않은 인기를 누렸다.
김 배우는 “온종일 줄을 서야 겨우 볼 수 있을 정도의 인기였다”라며 화려했던 유년시절을 회상했다.
집안에 넘쳐나는 예인의 끼 때문에 그녀 역시 다섯 살 때부터 무대에 섰다. 어머니의 아역으로 처음 무대에 선 그는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 어룽대는 조명, 관객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어 배우가 됐다고 했다.
1976년 극단 민예극장 입단, 1978년 국립창극단 입단, 1981년 국립극단에 입단해 활발한 활동을 펼친 그녀에게 남편 손진책은 연출가이자 극단 미추의 대표로 연극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다.
 1인 32역 ‘벽속의 요정’. /극단 미추 제공 |
김성녀는 35살이 되던 85년도에 뒤늦게 대학에 진학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마당놀이를 잘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마당놀이를 하며 모태였던 전통연희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생겼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장 한국적인 마당놀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서양 연극만 우러러보는 사람들의 인식도 바꾸고 싶었기 때문이다.
1990년 단국대학교 국악학과를 졸업한 뒤 중앙대 대학원에 진학, 김연수 명창의 완창 판소리 ‘춘향가’ 방송녹음 음반을 자료로 ‘김연수의 창작 판소리 연구-춘향가에 대하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2000년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과정이 설립되면서 교수로 영입되었는데, 2005년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음악극과 학과장을 거쳐 2007년 3월 제5대 국악대학장에 취임했다. 음악극 전공의 교수로서 학장, 대학원장을 겸임한 것인데 2011년 국악대가 예대로 통·폐합되면서 마지막 국악대학장으로 남게 됐다.
김 배우는 “학생들 사이에서 ‘쌍칼’ 혹은 ‘독사’로 불렸다”며 매서웠던 교수 생활을 회상했다.
“프로의 눈으로 아마추어들을 상대하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가르치는 대상이 다듬어지지 않은 학생 신분임을 종종 망각하고 완벽함을 이끌어내다보니 엄격하고도 무서운 교수였죠.”
그녀가 교수 생활 중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한 말 중 하나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추임새로 호응해 준다면 배우는 평생을 무대에 설 수 있다. 한 사람의 관객부터 감동시킬 수 있는 예술가가 되어라”다.
전통을 잇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가르쳤던 그녀는 음악극과 교수 시절 소리꾼과 배우들을 뽑아 한국적인 음악을 할 수 있는 배우들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했고 그 제자들이 오늘날 주역이 됐다.
그녀가 꼽는 제자로는 뮤지컬 배우 김준수, 가수 송가인 등이 있다.
그녀는 2012년 3월 국립극장 산하 국립창극단의 예술감독으로 임명돼 7년간을 이끌다 올해 6월 퇴임했다. 그녀가 일한 7년 간은 도전과 변화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부임 이후 곧장 창극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시도부터 했다. 기존의 ‘장화홍련’이라는 작품에서 ‘샤워 신’을 등장시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한태숙·고선웅 등 연극계의 스타 연출가들을 섭외했다.
그녀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원형을 유지하며 변하지 않고 그 시대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창극은 판소리에서 파생됐지만, 판소리와는 엄연히 다르다. 변화해야 한다”며 지론을 펼쳤다.
 ‘맛있는 만두 만드는 법’의 김성녀. /극단 미추 제공 |
반발은 심했지만 ‘관객이 보고 싶어하는 창극을 만든다’는 확신이 있었다. 굴하지 않고 한국 창극사를 새로 쓰는 과정을 꿋꿋하게 이어나갔다. 그리스 비극, 셰익스피어 고전 등 외국 작품을 창극으로 각색하고, 해외 유명 연출가들에게 우리 고전을 맡기는 파격을 감행하기도 했다. 색다른 시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연극·오페라 등 다른 장르의 연출가와 협업해 ‘SF창극’, ‘스릴러 창극’ 등 실험적인 작품도 만들어냈다. 이에 작품 대부분이 객석 점유율 80~90%를 웃돌며 인기를 끌었다. 창립 50년 만에 ‘배비장전’과 ‘장화홍련’은 매진 행렬을 기록했다. 해외 무대에도 활발하게 진출했다.
“2016년 싱가포르 출신 세계적 연출가인 옹켕센이 만든 ’트로이의 여인들‘로 유럽 투어에 나섰는데, 유럽인들이 공연이 끝난 뒤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줬죠. 전통이 통했다는 생각에 짜릿했어요.”
그녀는 교수와 감독직을 모두 내려놓고 현재 본연의 모습인 ‘배우’에 충실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2005년 손진책 연출가가 김성녀의 연기 인생 30주년을 기념해 선물로 준 모노드라마 ‘벽 속의 요정’은 1인 32역으로 그간 연기력을 응집해 폭발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작품은 국내에서 2005년 예술계 최고의 영예상인 ‘올해의 예술상’과 ‘동아연극상 연기상’, 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한국연극선정 ‘2006 공연베스트 7’에 선정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지금까지 연기할 수 있고, 나를 찾아주는 이들이 있고, 내가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이 매일 나를 새롭게 다잡습니다. 운이 좋은 것도 있지만 꾸준히 노력해 왔기에 잡은 내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살아왔기에 운이 좋았죠.”
끝으로 그녀는 “먼지 쌓인 극장은 어머니 품이자 요람”이라며 “무대 위에서 살아온 한평생, 그 삶을 사랑하며 숨이 끊어질 때까지 배우로서 살겠다. 김성녀의 삶을 사랑해준 팬들에게 무한한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민슬기 기자
 ‘맛있는 만두 만드는 법’의 김성녀. /극단 미추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