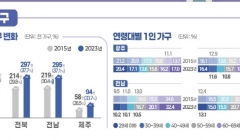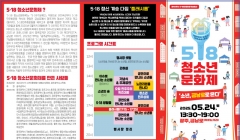탁현수 |
점점 절정으로 치닫는 불꽃의 신묘함에 이끌려 환호하다 보니 갑자기 맑고 조용한 밤하늘이 보고 싶어졌다. 어디쯤엔가 달이 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머리를 들어 사방을 둘러보았다. 회색빛 아파트로 둘러싸인 도시의 한쪽 귀퉁이에 스무이틀 하현달이 허여멀거니 빛을 잃고 넋이 나간 것처럼 박혀있다.
우리는 오랜 세월 ‘하늘’을 동경하며 살아왔다. 그 ‘하늘’은 높고 넓은 공간을 뜻하기도 하지만, 경외(敬畏)하는 절대자로서 ‘하느님’의 의미가 더 컸다. 선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욕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늘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해, 달, 별이 조금만 제빛을 잃어도, 홍수나 가뭄이 들어도, 바람의 기류가 수상쩍어도 혹여 부끄러운 짓을 해서 하늘이 노하지 않았는지 조심 또 조심했다. 하늘의 변화와 뜻을 읽어내려고 애를 썼으며 늘 혜택에 감사했다. 하늘을 향해 보내는 메시지 역시 겸손하고 소박했다. 분에 넘치지 않는 소망을 연(鳶)이나 종이비행기 등에 정결하게 실어 요란스럽지 않게 띄워 보내곤 했다.
어린 날, 하늘을 바라보는 일은 항상 설렘이었다. 양초로 반들반들 윤을 내어놓은 한옥 마루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거꾸로 누워서 바라보는 하늘은 그야말로 만화경이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형상들을 솜씨도 좋게 빚어서 펼쳐 놓는 요술쟁이 구름이 있고, 그 구름을 양 떼 몰 듯 마음대로 다루는 바람이 있었다. 여름밤, 마당의 평상에 누워서 바라보던 밤하늘은 또한 얼마나 장관이었던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무수한 별들이 어울려 술래잡기를 할 때면 덩달아 살금살금 숨고 싶었다. 내게 유년의 하늘은 신비로움으로 가득 찬 상상의 궁전이었으며, 희망의 날개를 달고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꿈의 공간이었다.
도회지 회색 벽에 갇혀 길다면 긴 세월을 바둥거리는 동안 슬금슬금 하늘이 사라져 버렸다. 철마다 다채로운 표정으로 감동을 주던 달도, 별도, 구름도 모두 오색 섬광을 발하는 빌딩 숲에 묻혀버렸다. 더 이상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라는 동요를 부르는 아이들도 없고, 하늘을 바라보며 꾸던 상상의 꿈도 ‘우주 정복’이라는 물결에 휩쓸려 화들짝 깨어버렸다. 죽고 살고, 이기고 지고, 사고팔고 등등에 매몰되어 현대인들은 하늘까지 바라볼 여유가 없다. 늘 심신이 피곤하고 바쁘기만 하다.
하늘을 볼 수 없으니 선과 악의 구별이 불분명해지고 순리를 역행하는 일에도 무감각하다. 힘없고 영악하지 못한 선한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게 무시무시한 블랙홀에 잠식당하고 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아 죽을 사람’, 이럴 때 이보다 적절한 말이 있을까. 한데 하늘의 가장 정당한 심판으로 여겼던 그 말조차 과학적인 근거와 원리로 조목조목 풀어버리는 세상이다.
‘은하수’, ‘달맞이’, ‘달무리’, ‘해맞이’, ‘해넘이’, ‘무지개’, ‘노을’, ‘햇무리’, ‘새털구름’, ‘양떼구름’…. 하늘이 보여주는 온갖 표정들이 몹시 그립고 보고 싶어지는 날이다.